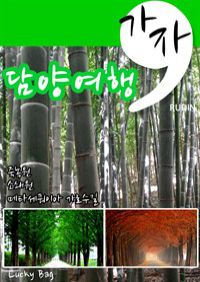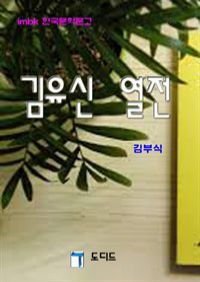최치원전 (한국고전소설)
- 저자
- 김부식
- 출판사
- 유페이퍼
- 출판일
- 2015-09-01
- 등록일
- 2016-08-0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신라 말 최고의 시인이자 문장가로 알려진 최치원에 대한 기록이다. 김부식이 편찬한 역사서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최치원에 관한 객관적인 사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치원전」은 신라 말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최치원에 관한 열전으로 『삼국사기』 46권, 열전 제6에 수록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1145년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김부식이 기전체(紀傳體) 방식으로 엮은 50권 10책의 역사서이다.
고전소설에서 최치원은 신선과 같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수이전』 일문에 있는 「최치원전」에는 최치원이 두 명의 처녀귀신과 만나 시를 읊으며 연분을 맺은 내용이 환상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신광한이 지은 「최생우진기」에서 주인공 최생의 먼 조상이 되는 신선으로 나타난다. 「대관재몽유록」에서는 천상세계에서 최대의 문장가로 추앙된 까닭에 천자가 되어 있는 최치원이 등장한다. 그런가하면 활자본 고전소설 「최치원전」에서는 최치원의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되고, 선녀가 하강하여 최치원을 기르는 등, 환상적인 사건이 다수 등장한다. 최치원이 걸출한 문장실력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명성을 떨쳤는데, 말년에 가야산에 은거하여 그 종적이 희미하였기 때문에 더욱 신비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에 비해 김부식이 지은 「최치원전」은 12세 때 당나라로 건너가 빈공과에 급제한 후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벼슬을 받고, 황소의 난 때 공을 세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최치원전」에는 최치원이 신라로 돌아온 후 대사시중에게 올린 장계가 있는데, 이는 당시 삼국과 중국의 정세나 양국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김부식은 세상에 뜻을 펼치지 못한 최치원이 경주의 남산, 강주의 빙산, 합주의 청량사 등을 유랑하였음을 밝혀 최치원의 행적과 머물렀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김부식은 유교적인 윤리관을 근거로 삼국의 역대 인물에 대해 당대의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최치원전」은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에 입각한 실존인물에 관한 전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치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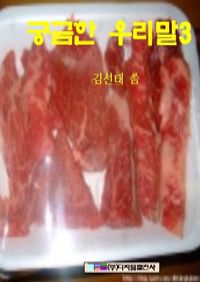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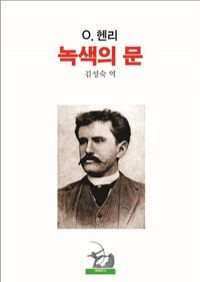
![[음모론 소설] 안티 시스템 1~4권 (합본)](/images/bookimg/ALADIN/E142436135.jpg)